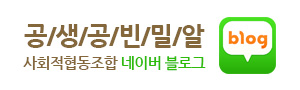사회사목연구
민관 거버넌스를 위하여
관리자
0
1,350
2019.08.11 20:50
* 이 글은 2016.8.5 성북구에서 자치단체 간부들과 시민 영역 간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야기한 자료다.
민관 거버넌스를 위하여
요즘 협치, 거버넌스, 연정, 합작 등의 말들을 자주 접한다.
그 필요의 절실함과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안타깝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나는 인문운동가로서 그 ‘인문적 기초’가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느껴오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인문운동은 최전선(最前線)이다.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마 관(官)과 사업을 같이 해 본 사람들이면 대체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관(官)이 발주한 사업을 시민단체가 맡아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나 시민창안사업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을 민관 거버넌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글자로는 민(民)이 앞서 있는데, 실제로는 관(官)이 주도하고, 민(民)은 관(官)의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는 둘러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요즘 공무원은 가장 선망 받는 직업이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관(官)의 문화가 잘 바꿔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수한 인재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오래된 문화에 동화되어 간다.
그것은 관료주의(官僚主義)라고 부르는 너무나 오래된 문화다.
상당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오래된 문화가 바뀌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관(官)과 같이 일을 해 본 사람은 이것을 느낀다.
우리 국어 사전에는 관료주의를 “관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독선적, 형식적, 획일적, 억압적, 비민주적인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백과사전에는 “관료제는 비밀주의, 번문욕례(繁文縟禮), 선례답습, 획일주의, 법규만능, 창의의 결여, 직위이용, 오만 등의 권위주의적 부작용이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관료주의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적어 놓고 있다.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의식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성과(업적)주의, 형식주의, 상명하복, 안전추구(保身) 등은 창의성을 막는 답답함으로 다가온다.
민관거버넌스의 한 쪽 주체인 ‘민(民)’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형성된 ‘시민’이다.
시혜(施惠)의 대상과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버넌스가 어렵다.
‘시민’은 어느 정도의 부(富)와 어느 정도의 교양(敎養;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아는 것)을 갖춘 한국 근대화의 귀한 산물이다.
아직 진정한 시민주체로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넘는 책임 주체로서 갖추어야할 인문적 토대를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극단적 지지나 극단적 반대는 책임 있는 주체의 태도가 아니다.
수평적 관계의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용(똘레랑스보다 더 오랜 ‘서恕’의 동양적 전통을 현대에 살리면 된다.)의 정신이 성숙해야 한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 편으로 기우는 ‘공공성’이라는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협애한 국가‧민족 의식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선례가 없는 빠른 기간에 이루어진 산업화‧민주화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혁 주체를 갖게 될 것인데, 이런 주체를 나는 ‘신중간층’이라고 부르고 있다.
블루칼라와 회이트칼라,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변화를 시도하는 관(官) 특히 자치단체와 성숙한 시민주체 간에 진정한 거버넌스가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업그레이드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쌍방의 문화지체 현상은 몇 번의 강의나 교육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쌍방의 변화를 구체적인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함께 그 연습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디엔가 모범(모델)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번져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과문(寡聞)이지만, 몇몇 곳이 들려온다.
익산의 경우는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곳이어서 그 추이를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곳의 하나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장단점이 있지만, 자치구 단위로 모범이 만들어진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民)이나 관(官)이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주체들이 있고, 참을성 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진전해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금으로서는 시민주체는 ‘책임’ 있는 창의성을, 자치단체는 주도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돕는 방식의 상호보완을 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인문운동가로서 민관거버넌스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뿌리내림을 위해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다음의 테마들을 함께 검토해보려 한다.
--소통은 윤리적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과학적 태도
논어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은 소통과 탐구를 위한 오래된 지혜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야말로 더욱 보편적인 테마로 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것이 있겠는가? 아는 것이 없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오더라도, 텅 비어 있는 데서 출발하여 그 양 끝을 들추어내어 마침내 밝혀 보리라.” (제9편 자한)
子曰, 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兩端而竭焉 >
1) 무지(無知)의 자각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소통(疏通)·경청(傾聽) 등이 있다.
그 만큼 시대는 합의나 화합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그 바탕으로 되는 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신앙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나 집단일수록 더욱 그렇다.
도덕적 윤리적 요구로, 또는 전체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아무리 소통을 강조해도, 자기 생각의 바탕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아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단정(斷定)이 있는 한 소통은 실질적이지 않다.
편가름·배척·자기중심성의 바탕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내 생각이 틀림 없다’ 또는 ‘내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단정이 있다.
공자와 같은 뛰어난 현자는 이미 2500여년 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도 이것을 깨달았다.
요즘은 중학교 정도만 공부해도 과학적으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만 자신의 감각에 의한 상(像)과 자신의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무지(無知)를 자각한 징표
무지의 자각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념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신념이나 신앙이 깊은 것을 비판하려는 말이 아니다.
강한 정치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각을 가장 하기 힘들어 하는 부류의 하나다.
무지의 자각은 깜깜한 무지의 암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적어도 공자의 세계에서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이나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연찬과 통하는 것이다.
무지의 자각은 참다운 탐구의 시작이다.
그래서 무지를 자각한 사람의 상태는 ‘설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아집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상쾌함이며, 탐구의 기쁨이다.
논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말이 논어 맨 처음에 나오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가 그것이다.
무지를 자각한 상태에서야말로 배우는 것이 기쁜 것이다. 자기가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탐구는 끝나고, 단정만 남는다.
공야장 편 28장에 “집 열채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충’과 ‘신’의 면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 十室之邑 必有忠信 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공자의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3) 연찬태도(硏鑽態度)
‘무지(無知)의 자각’은 소통과 탐구의 출발점이다.
앞에 소개한 문장의 두 번째 단락이 연찬태도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오더라도, 텅 비어 있는 데서 출발하여 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
비부鄙夫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요즘 말로 해석하면 누가 물어 오더라도 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고, 나아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소통하고 탐구한다는 의미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핵심은 그 태도인데 ‘공공(空空)’이라고 ‘빌 공’ 자(字)를 두 번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무지의 자각과 결부하여 자신의 지식·경험·가치관·신념 등을 다 비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특히 자기의 식견이나 가치관 또는 신념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하거나 허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가치관이나 신념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야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사실은 그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하는 순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지배되는 것이다.
지배된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이다.
누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화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한자(漢字)로 보면 노예(奴)의 마음(心) 즉 노(怒)가 되는 것이다.
단정하지 않고, 즉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의 지식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지식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空空)이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내 생각이 틀림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없는 생각을 비우라는 것이다.
비우려고 애쓸 것 까지도 없다.
즉 자신의 생각은 실재와는 별개로 ‘자신의 감각과 판단이라는 자각’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연찬태도란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토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이 옳은가를 모두의 지혜를 활용해서 탐구하는 과정’으로 되는 것이다.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되, 다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 서면 공자의 다음과 같은 말들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다.
<공자 말하기를 “군자는 세상 모든 일에 옳다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도 따로 없이, 오직 의를 좇을 뿐이다.”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제4편 이인)
4) 철저구명(徹底究明)
소통(疏通)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함께 의논하고 합의해서 해결할 과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소통(疏通)이 강조될 필요가 없다.
소통은 그 시점(時點)의 공동의 목표와 그것에 도달할 방법과 그 구체적 실천에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수직적 사회(전제나 독재, 계급사회)에 저항하는 것과 수평 사회의 소통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
제도적으로 수직 사회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수평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수평 사회라고 말하기 힘들다.
일종의 문화지체(文化遲滯;의식意識과 문화의 변화가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가 있기 마련이고, 급격하게 제도가 변하는 경우는 그것이 더욱 심각하다.
아마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로 나는 이 문화지체(文化遲滯)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인문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인문운동은 문화지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워낙 소통이 어려우니까, 마치 소통 그 자체가 목적처럼 되고 있지만, 그것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수평적 소통은 자기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자기의 주관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전술(前述)한 바가 있다.
주장하되, 사로잡히거나 지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단적 문화로 되는 것이 진정한 수평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락이 연찬태도에 입각한 철저 구명을 나타낸다.
“그 양 끝을 두들겨 마침내 밝혀 보겠다.” 我叩其兩端而竭焉
그 양 끝(兩端)을 두들겨(叩) 밝혀보겠다(竭)는 문장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단지 그 양 끝만이 아니라 그 양 끝 사이에 있는 무수한 스펙트럼을 포함하여, 두들긴다(叩)는 것은 어떤 단정도 없이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양 끝 주장(端)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거나 배제하는 마음이 없다.
많은 해설서들이 갈(竭)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는 한자(漢字)에 대한 공부가 없어서, 그 한자(漢字)적 의미는 잘 모르지만, 밝혀 보겠다로 번역하였다.
‘무지(無知)의 자각’에서 출발한 탐구인데, 가르친다는 말로 결론을 내는 것은 전체 문장을 더 나아가서 공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이 문장에서는 공자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연찬(硏鑽)이다.
이 문장과 관련해서 논어 위정편에 ‘공호이단 사해야이’ 攻乎異端 斯害也已라는 문장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많은 해설서들이 ‘이단을 행하는 것(또는 공부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라고 해석을 한다.
소수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것은 공자 사상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나는 후자의 해석이 공자의 뜻에 부합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공자 사상이 정치나 종교 권력으로 이용되었을 때, 그 왜곡이 가장 심한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단 논쟁은 비단 유교 이외의 것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교 안에서도 나타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내가 논어를 강독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은 공자 사상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단(端)도 검토의 대상일 뿐이다.
나는 우리 현실에서 이 양단(兩端)의 범위가 무한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상당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 공자 정도의 현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웠던 통찰이 누구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물질적·제도적 준비도 꽤 마련하였다.
나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높이 비상飛翔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갇힌 상상력을 해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인문적 기초를 토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의 하나로 보고 있다.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안에서 가장 뛰어난 ‘자유욕구’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사람의 자유 욕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억압이나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셋째는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인 ‘관념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자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사람의 자유욕구와 지적능력이 힘을 발휘해 온 것이 ‘역사(歷史)’라고 할 수 있다.
공자의 이 세 방향의 자유에 대한 방향 제시가 현대에 와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1)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먼저다.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실 때 염유가 수레를 몰고 따르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참 많구나.”
염유가 말씀드렸다.
“백성이 많아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염유가 다시 여쭈었다.
“부유해지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쳐야 한다.”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旣富矣 又何加焉 曰, 敎之 (子路 第十三)>
공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도덕주의자·정신주의자로 보는 것이다.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상주의자였다.
그의 인간에 대한 고찰은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이었다.
인간의 1차적 행복의 조건을 ‘물질적 수요의 충족’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는 않는다.
물질적 수요의 충족(富)이 정신적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주의자나 도덕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생각들은 물질은 풍부해 졌지만 정신이 성숙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대에 와서 더욱 인간에 대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고찰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는 물질적 부(富)가 정신적 성숙의 바탕으로 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부(富)를 추구하였다.
< 공자 말하기를 “부를 구함이 옳은 것이라면 비록 마부 노릇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에 따라 살리라.”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제 7편 술이)>
그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그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즉 먹고 사는 것이 당장의 목표인 사람이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공자 말하기를,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子曰 貧而無怨 難 富而無驕 易 (제 14편 헌문)>
여기서는 원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망과 함께 아첨(비굴)이라는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장들에서 공자는 아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2) 부(富)와 교양(敎養)을 갖춘 시민계급
공자의 이상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봉건적 신분계급제와 절대왕정의 압제에 저항하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근대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시민계급을 통해서다.
그들의 힘의 원천은 ‘부(富)와 교양(敎養)’이었다.
공자가 2500년 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기둥이었다.
지금은 ‘월가를 점령하라’든지, ‘1%대 99%의 사회’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부와 교양을 갖춘 중산층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산층에 대한 유럽의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페어플레이를 할 것 / -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 -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모 연봉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결과라서 일반화하긴 힘들더라도 다음과 같다.
-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 - 2,000cc 이상의 중형차
- 잔고 1억 원 이상의 예금액 / - 1년에 1회 이상의 해외여행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한국은 시민계급이 정신적으로 성숙할 만큼의 역사적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때 인문학 열풍이 불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인문운동 즉 삶의 가치와 질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3) 공자가 제시하는 정신적 성숙의 목표
<자공子貢이 여쭈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면서도 교만함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여쭈었다.
“《시경》에서 말하는 절차탁마切磋琢磨란 바로 이를 말하는 건가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賜야, 비로소 함께 시를 논할 만하구나. 하나를 말하면 그 다음을 아는구나!”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學而 第一)>
참으로 윗 문장은 대단하다.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어냐는 질문에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富之)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부유해진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가르쳐야 한다(敎之)’라고 답한다.
부유해진다고 저절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성숙의 목표에 대해서 ‘빈이무첨(貧而無諂)’ ‘부이무교(富而無驕)’ 정도면 어떻겠느냐고 제자 자공(子貢)이 묻는다.
공자는 그 정도도 좋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빈이무첨(貧而無諂)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비굴해지거나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원망하는 마음도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공자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것이 ‘빈이락(貧而樂)’ 과 ‘부이호례(富而好禮)’다.
빈이락(貧而樂)은 ‘가난하면서도 즐긴다’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오해가 많다.
가난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생태주의에서 사용하는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이 있다. 공생공빈(共生共貧)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분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 말들이 보편성을 띠려면, 현대인들의 높은 자유도와 부합되어야 한다.
즉 즐거워야 하는 것이다. 이제 사명감이나 의무감으로는 보편성을 획득하기도 지구적(持久的)일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빈이락(貧而樂)은 가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가난은 원망하거나 아첨하는 마음 없이 받아들이고(安貧), 도를 즐기는(樂道) 것이다.
자기 책임이 아닌 가난에 대해 컴플렉스(열등감)를 느끼지 않으며, 정신적·예술적 욕구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즉 욕구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물질에 대한 수요나 욕망은 부자유 없이 감소한다. 말하자면 ‘자발적 풍요’인 셈이다. 나는 ‘자발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 뜻은 같으리라고 본다.
아마 ‘단순소박한 삶’, ‘소유에서 존재로의 삶’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는 사실 상당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바탕에서 나타난다.
자기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회전반의 물질적 풍요가 그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말은 현대에 와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사회, 차별이 없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의식이 없고,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부이호례(富而好禮)’도 ‘부이무교(富而無驕)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예(禮)’야말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태산(泰山)이나 종묘(宗廟)에서 제사(祭祀) 지내는 의식 절차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아름다운 질서’ 또는 ‘이상적인 관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
빈이락(貧而樂)은 가난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다. 그 즐거움(당당함)의 바탕이 물신지배의 차가운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밝은 비전일 수도 있고, 높은 정신적 가치가 만들어내는 긍지일 수도 있다.
‘부이호례 (富而好禮)’의 예(禮)는 양보(讓)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아름다운 질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보인다.
공자의 말이다. “예와 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양이 조화되지 않으면 예가 무슨 소용인가?” 能以禮讓 爲國乎 何有 不能以禮讓 爲國 如禮何.
부이호례富而好禮를 요즘 말로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나누고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가난하지만 원한에 사무치거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貧而樂)’이 ‘나누고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는(富而好禮) 부자들과 손잡을 때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선 부(富)는 자본주의에, 교(敎)는 중국 공산당이 맡는 세기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 성패는 인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들어 올리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떨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자발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다.
당당한 빈자들과 양보하고 싶어 하는 부자들의 ‘아름다운 합동작업’을 고대한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합작(合作)’ 운동이다.
4) 어떤 의식과 어떤 생산력이 미래의 이상 사회를 가능케할까?
요즘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바람이 한 차례 불었다.
내적 동력이 그런 바람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외부의 환경들이 그런 바람을 만든 면이 강하다. 사실 그러다보니 거품도 엄청 많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거품은 빠져 나가고, 한국형 협동조합들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내릴 수 있는지가 엄중하게 물어지는 시기가 되었다.
어떤 점에서는 낡은 진영논리를 넘어 경제의 최전선에서 과거의 좌우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넘어서는 사상과 실천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장쾌한 그림이지만, 협동조합의 생산력이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 안에 포섭된다. 그래서 체제순응적이다.
그런데 내부의 작동원리는 이윤동기와 경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혁명적이다.
이 조화가 폭력과 무리(無理)없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윤동기와 경쟁을 넘어서는 동기로 작동되는 협동조합의 생산력이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일반기업과의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제적 동기로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동시에 경제외적 ‘거룩한’ 동기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과연 ‘자발적이고, 자기실현의 고도한 집중이 즐겁게’ 생산력으로 전화(轉化)할 수 있는가?
핵심은 ‘사람’이다.
공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공자가 말하기를, “삼(參)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
증자가 말했다. “예, 그러합니다.”
공자가 나가자 제자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忠)과 서(恕)일 따름이다.” (제4편 이인)
子曰, 參乎 吾道 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 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공자가 일이관지(一以貫之)했다는 충(忠)과 서(恕)는 단지 마음의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룬다.
서(恕)는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충(忠)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하는 상태다. 서(恕)는 참는 것(忍)과 다르며, 충(忠)은 의무나 사명감과 다르다.
자타(自他)의 생명력을 최대로 신장하는 것이다.
즐겁지 않으면 가짜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력으로 전화(轉化)되지 않으면 가짜다.
이 지면에서 여기에 대해 상술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내가 협동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물적 토대가 상당히 갖추어진 조건과 경쟁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기실현의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 등은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나는 중견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꿈을 가끔 꿀 때가 있다.
이 때 그 내부의 동력은 표현을 무어라 하더라도 서(恕)와 충(忠)의 현대적 살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진보다.
5) 민관거버넌스의 성공적 정착을 그리며
윗 글은 민관거버넌스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약간 유추하면 관(官)이 갑(甲)이 되고, 민(民)이 을(乙)이 되는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는데, 민(民)과 관(官)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부(富)를 갑(甲)으로 바꾸고, 빈(貧)을 을(乙)로 바꿔서 읽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당당한 시민활동가들과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의지가 있는 공무원들이 만나야 한다.
시민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은 어떻게 하면 활동가들이 당당하고 즐겁게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정관념’ 없이 모색해야 한다.
공무원 가운데는 국장 급 이상의 간부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실무자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수시로 바뀌는 단체장의 의지보다 직업공무원의 상부가 변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공무원 노조’가 이 역할을 스스로의 중요한 실천적 임무로 받아들이면,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공무원 사회 안에서 여러 벽을 허물고 거버넌스할 수 있는 기풍이 조성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자나 연구자들이 선진 외국의 변천 사례를 실용성 있게 연구하여 공급하는 일도 중요하다.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시민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모여드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은 그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
민관 거버넌스를 위하여
요즘 협치, 거버넌스, 연정, 합작 등의 말들을 자주 접한다.
그 필요의 절실함과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안타깝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나는 인문운동가로서 그 ‘인문적 기초’가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느껴오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인문운동은 최전선(最前線)이다.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마 관(官)과 사업을 같이 해 본 사람들이면 대체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관(官)이 발주한 사업을 시민단체가 맡아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나 시민창안사업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을 민관 거버넌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글자로는 민(民)이 앞서 있는데, 실제로는 관(官)이 주도하고, 민(民)은 관(官)의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는 둘러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요즘 공무원은 가장 선망 받는 직업이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관(官)의 문화가 잘 바꿔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수한 인재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오래된 문화에 동화되어 간다.
그것은 관료주의(官僚主義)라고 부르는 너무나 오래된 문화다.
상당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오래된 문화가 바뀌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관(官)과 같이 일을 해 본 사람은 이것을 느낀다.
우리 국어 사전에는 관료주의를 “관료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독선적, 형식적, 획일적, 억압적, 비민주적인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백과사전에는 “관료제는 비밀주의, 번문욕례(繁文縟禮), 선례답습, 획일주의, 법규만능, 창의의 결여, 직위이용, 오만 등의 권위주의적 부작용이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관료주의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적어 놓고 있다.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의식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성과(업적)주의, 형식주의, 상명하복, 안전추구(保身) 등은 창의성을 막는 답답함으로 다가온다.
민관거버넌스의 한 쪽 주체인 ‘민(民)’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형성된 ‘시민’이다.
시혜(施惠)의 대상과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버넌스가 어렵다.
‘시민’은 어느 정도의 부(富)와 어느 정도의 교양(敎養;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아는 것)을 갖춘 한국 근대화의 귀한 산물이다.
아직 진정한 시민주체로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넘는 책임 주체로서 갖추어야할 인문적 토대를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극단적 지지나 극단적 반대는 책임 있는 주체의 태도가 아니다.
수평적 관계의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용(똘레랑스보다 더 오랜 ‘서恕’의 동양적 전통을 현대에 살리면 된다.)의 정신이 성숙해야 한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는 공익 편으로 기우는 ‘공공성’이라는 균형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협애한 국가‧민족 의식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선례가 없는 빠른 기간에 이루어진 산업화‧민주화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혁 주체를 갖게 될 것인데, 이런 주체를 나는 ‘신중간층’이라고 부르고 있다.
블루칼라와 회이트칼라,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변화를 시도하는 관(官) 특히 자치단체와 성숙한 시민주체 간에 진정한 거버넌스가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업그레이드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쌍방의 문화지체 현상은 몇 번의 강의나 교육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쌍방의 변화를 구체적인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함께 그 연습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어디엔가 모범(모델)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번져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과문(寡聞)이지만, 몇몇 곳이 들려온다.
익산의 경우는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곳이어서 그 추이를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곳의 하나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장단점이 있지만, 자치구 단위로 모범이 만들어진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民)이나 관(官)이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주체들이 있고, 참을성 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진전해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금으로서는 시민주체는 ‘책임’ 있는 창의성을, 자치단체는 주도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돕는 방식의 상호보완을 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인문운동가로서 민관거버넌스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뿌리내림을 위해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다음의 테마들을 함께 검토해보려 한다.
- 소통(疏通)은 과학이다.
--소통은 윤리적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과학적 태도
논어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은 소통과 탐구를 위한 오래된 지혜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야말로 더욱 보편적인 테마로 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것이 있겠는가? 아는 것이 없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오더라도, 텅 비어 있는 데서 출발하여 그 양 끝을 들추어내어 마침내 밝혀 보리라.” (제9편 자한)
子曰, 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兩端而竭焉 >
1) 무지(無知)의 자각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소통(疏通)·경청(傾聽) 등이 있다.
그 만큼 시대는 합의나 화합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그 바탕으로 되는 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신앙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나 집단일수록 더욱 그렇다.
도덕적 윤리적 요구로, 또는 전체의 존속과 행복을 위해 아무리 소통을 강조해도, 자기 생각의 바탕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아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단정(斷定)이 있는 한 소통은 실질적이지 않다.
편가름·배척·자기중심성의 바탕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내 생각이 틀림 없다’ 또는 ‘내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단정이 있다.
공자와 같은 뛰어난 현자는 이미 2500여년 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도 이것을 깨달았다.
요즘은 중학교 정도만 공부해도 과학적으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만 자신의 감각에 의한 상(像)과 자신의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무지(無知)를 자각한 징표
무지의 자각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념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신념이나 신앙이 깊은 것을 비판하려는 말이 아니다.
강한 정치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각을 가장 하기 힘들어 하는 부류의 하나다.
무지의 자각은 깜깜한 무지의 암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적어도 공자의 세계에서는 “불가지론(不可知論)”이나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연찬과 통하는 것이다.
무지의 자각은 참다운 탐구의 시작이다.
그래서 무지를 자각한 사람의 상태는 ‘설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아집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상쾌함이며, 탐구의 기쁨이다.
논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말이 논어 맨 처음에 나오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가 그것이다.
무지를 자각한 상태에서야말로 배우는 것이 기쁜 것이다. 자기가 알아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탐구는 끝나고, 단정만 남는다.
공야장 편 28장에 “집 열채 정도의 작은 마을에도 ‘충’과 ‘신’의 면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 十室之邑 必有忠信 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공자의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3) 연찬태도(硏鑽態度)
‘무지(無知)의 자각’은 소통과 탐구의 출발점이다.
앞에 소개한 문장의 두 번째 단락이 연찬태도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오더라도, 텅 비어 있는 데서 출발하여 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
비부鄙夫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요즘 말로 해석하면 누가 물어 오더라도 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고, 나아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소통하고 탐구한다는 의미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핵심은 그 태도인데 ‘공공(空空)’이라고 ‘빌 공’ 자(字)를 두 번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무지의 자각과 결부하여 자신의 지식·경험·가치관·신념 등을 다 비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특히 자기의 식견이나 가치관 또는 신념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하거나 허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가치관이나 신념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야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사실은 그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하는 순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지배되는 것이다.
지배된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이다.
누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화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한자(漢字)로 보면 노예(奴)의 마음(心) 즉 노(怒)가 되는 것이다.
단정하지 않고, 즉 주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의 지식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지식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空空)이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내 생각이 틀림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없는 생각을 비우라는 것이다.
비우려고 애쓸 것 까지도 없다.
즉 자신의 생각은 실재와는 별개로 ‘자신의 감각과 판단이라는 자각’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연찬태도란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토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이 옳은가를 모두의 지혜를 활용해서 탐구하는 과정’으로 되는 것이다.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되, 다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 서면 공자의 다음과 같은 말들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다.
<공자 말하기를 “군자는 세상 모든 일에 옳다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도 따로 없이, 오직 의를 좇을 뿐이다.”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제4편 이인)
4) 철저구명(徹底究明)
소통(疏通)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함께 의논하고 합의해서 해결할 과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소통(疏通)이 강조될 필요가 없다.
소통은 그 시점(時點)의 공동의 목표와 그것에 도달할 방법과 그 구체적 실천에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수직적 사회(전제나 독재, 계급사회)에 저항하는 것과 수평 사회의 소통과는 다른 점들이 있다.
제도적으로 수직 사회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수평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수평 사회라고 말하기 힘들다.
일종의 문화지체(文化遲滯;의식意識과 문화의 변화가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가 있기 마련이고, 급격하게 제도가 변하는 경우는 그것이 더욱 심각하다.
아마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로 나는 이 문화지체(文化遲滯)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인문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인문운동은 문화지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워낙 소통이 어려우니까, 마치 소통 그 자체가 목적처럼 되고 있지만, 그것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수평적 소통은 자기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자기의 주관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전술(前述)한 바가 있다.
주장하되, 사로잡히거나 지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단적 문화로 되는 것이 진정한 수평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락이 연찬태도에 입각한 철저 구명을 나타낸다.
“그 양 끝을 두들겨 마침내 밝혀 보겠다.” 我叩其兩端而竭焉
그 양 끝(兩端)을 두들겨(叩) 밝혀보겠다(竭)는 문장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단지 그 양 끝만이 아니라 그 양 끝 사이에 있는 무수한 스펙트럼을 포함하여, 두들긴다(叩)는 것은 어떤 단정도 없이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양 끝 주장(端)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거나 배제하는 마음이 없다.
많은 해설서들이 갈(竭)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는 한자(漢字)에 대한 공부가 없어서, 그 한자(漢字)적 의미는 잘 모르지만, 밝혀 보겠다로 번역하였다.
‘무지(無知)의 자각’에서 출발한 탐구인데, 가르친다는 말로 결론을 내는 것은 전체 문장을 더 나아가서 공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이 문장에서는 공자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연찬(硏鑽)이다.
이 문장과 관련해서 논어 위정편에 ‘공호이단 사해야이’ 攻乎異端 斯害也已라는 문장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많은 해설서들이 ‘이단을 행하는 것(또는 공부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라고 해석을 한다.
소수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것은 공자 사상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갈림길이다.
나는 후자의 해석이 공자의 뜻에 부합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공자 사상이 정치나 종교 권력으로 이용되었을 때, 그 왜곡이 가장 심한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단 논쟁은 비단 유교 이외의 것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교 안에서도 나타나 권력 투쟁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내가 논어를 강독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은 공자 사상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단(端)도 검토의 대상일 뿐이다.
나는 우리 현실에서 이 양단(兩端)의 범위가 무한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상당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 공자 정도의 현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웠던 통찰이 누구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물질적·제도적 준비도 꽤 마련하였다.
나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높이 비상飛翔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갇힌 상상력을 해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인문적 기초를 토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의 하나로 보고 있다.
- 물질과 정신의 조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안에서 가장 뛰어난 ‘자유욕구’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사람의 자유 욕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억압이나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셋째는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인 ‘관념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자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사람의 자유욕구와 지적능력이 힘을 발휘해 온 것이 ‘역사(歷史)’라고 할 수 있다.
공자의 이 세 방향의 자유에 대한 방향 제시가 현대에 와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1)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먼저다.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실 때 염유가 수레를 몰고 따르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참 많구나.”
염유가 말씀드렸다.
“백성이 많아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염유가 다시 여쭈었다.
“부유해지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쳐야 한다.”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旣富矣 又何加焉 曰, 敎之 (子路 第十三)>
공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도덕주의자·정신주의자로 보는 것이다.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상주의자였다.
그의 인간에 대한 고찰은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이었다.
인간의 1차적 행복의 조건을 ‘물질적 수요의 충족’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는 않는다.
물질적 수요의 충족(富)이 정신적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주의자나 도덕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생각들은 물질은 풍부해 졌지만 정신이 성숙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대에 와서 더욱 인간에 대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고찰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는 물질적 부(富)가 정신적 성숙의 바탕으로 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도 정당한 부(富)를 추구하였다.
< 공자 말하기를 “부를 구함이 옳은 것이라면 비록 마부 노릇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에 따라 살리라.”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제 7편 술이)>
그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그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즉 먹고 사는 것이 당장의 목표인 사람이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공자 말하기를,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子曰 貧而無怨 難 富而無驕 易 (제 14편 헌문)>
여기서는 원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망과 함께 아첨(비굴)이라는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장들에서 공자는 아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2) 부(富)와 교양(敎養)을 갖춘 시민계급
공자의 이상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의 근대화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봉건적 신분계급제와 절대왕정의 압제에 저항하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근대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시민계급을 통해서다.
그들의 힘의 원천은 ‘부(富)와 교양(敎養)’이었다.
공자가 2500년 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기둥이었다.
지금은 ‘월가를 점령하라’든지, ‘1%대 99%의 사회’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부와 교양을 갖춘 중산층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산층에 대한 유럽의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페어플레이를 할 것 / -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 -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모 연봉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결과라서 일반화하긴 힘들더라도 다음과 같다.
-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 - 2,000cc 이상의 중형차
- 잔고 1억 원 이상의 예금액 / - 1년에 1회 이상의 해외여행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한국은 시민계급이 정신적으로 성숙할 만큼의 역사적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때 인문학 열풍이 불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인문운동 즉 삶의 가치와 질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3) 공자가 제시하는 정신적 성숙의 목표
<자공子貢이 여쭈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함이 없으며, 부유하면서도 교만함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며,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여쭈었다.
“《시경》에서 말하는 절차탁마切磋琢磨란 바로 이를 말하는 건가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賜야, 비로소 함께 시를 논할 만하구나. 하나를 말하면 그 다음을 아는구나!”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學而 第一)>
참으로 윗 문장은 대단하다.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어냐는 질문에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富之)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부유해진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가르쳐야 한다(敎之)’라고 답한다.
부유해진다고 저절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성숙의 목표에 대해서 ‘빈이무첨(貧而無諂)’ ‘부이무교(富而無驕)’ 정도면 어떻겠느냐고 제자 자공(子貢)이 묻는다.
공자는 그 정도도 좋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빈이무첨(貧而無諂)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비굴해지거나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원망하는 마음도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공자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것이 ‘빈이락(貧而樂)’ 과 ‘부이호례(富而好禮)’다.
빈이락(貧而樂)은 ‘가난하면서도 즐긴다’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오해가 많다.
가난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생태주의에서 사용하는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이 있다. 공생공빈(共生共貧)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분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 말들이 보편성을 띠려면, 현대인들의 높은 자유도와 부합되어야 한다.
즉 즐거워야 하는 것이다. 이제 사명감이나 의무감으로는 보편성을 획득하기도 지구적(持久的)일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빈이락(貧而樂)은 가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가난은 원망하거나 아첨하는 마음 없이 받아들이고(安貧), 도를 즐기는(樂道) 것이다.
자기 책임이 아닌 가난에 대해 컴플렉스(열등감)를 느끼지 않으며, 정신적·예술적 욕구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즉 욕구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물질에 대한 수요나 욕망은 부자유 없이 감소한다. 말하자면 ‘자발적 풍요’인 셈이다. 나는 ‘자발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 뜻은 같으리라고 본다.
아마 ‘단순소박한 삶’, ‘소유에서 존재로의 삶’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는 사실 상당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바탕에서 나타난다.
자기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회전반의 물질적 풍요가 그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말은 현대에 와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사회, 차별이 없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의식이 없고,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부이호례(富而好禮)’도 ‘부이무교(富而無驕)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예(禮)’야말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태산(泰山)이나 종묘(宗廟)에서 제사(祭祀) 지내는 의식 절차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아름다운 질서’ 또는 ‘이상적인 관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
빈이락(貧而樂)은 가난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다. 그 즐거움(당당함)의 바탕이 물신지배의 차가운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밝은 비전일 수도 있고, 높은 정신적 가치가 만들어내는 긍지일 수도 있다.
‘부이호례 (富而好禮)’의 예(禮)는 양보(讓)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아름다운 질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보인다.
공자의 말이다. “예와 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양이 조화되지 않으면 예가 무슨 소용인가?” 能以禮讓 爲國乎 何有 不能以禮讓 爲國 如禮何.
부이호례富而好禮를 요즘 말로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나누고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가난하지만 원한에 사무치거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貧而樂)’이 ‘나누고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는(富而好禮) 부자들과 손잡을 때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선 부(富)는 자본주의에, 교(敎)는 중국 공산당이 맡는 세기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 성패는 인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국 공산당이 공자를 들어 올리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떨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자발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다.
당당한 빈자들과 양보하고 싶어 하는 부자들의 ‘아름다운 합동작업’을 고대한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합작(合作)’ 운동이다.
4) 어떤 의식과 어떤 생산력이 미래의 이상 사회를 가능케할까?
요즘 우리나라에 협동조합 바람이 한 차례 불었다.
내적 동력이 그런 바람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외부의 환경들이 그런 바람을 만든 면이 강하다. 사실 그러다보니 거품도 엄청 많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거품은 빠져 나가고, 한국형 협동조합들이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내릴 수 있는지가 엄중하게 물어지는 시기가 되었다.
어떤 점에서는 낡은 진영논리를 넘어 경제의 최전선에서 과거의 좌우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넘어서는 사상과 실천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장쾌한 그림이지만, 협동조합의 생산력이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 안에 포섭된다. 그래서 체제순응적이다.
그런데 내부의 작동원리는 이윤동기와 경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혁명적이다.
이 조화가 폭력과 무리(無理)없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윤동기와 경쟁을 넘어서는 동기로 작동되는 협동조합의 생산력이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일반기업과의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제적 동기로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동시에 경제외적 ‘거룩한’ 동기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과연 ‘자발적이고, 자기실현의 고도한 집중이 즐겁게’ 생산력으로 전화(轉化)할 수 있는가?
핵심은 ‘사람’이다.
공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공자가 말하기를, “삼(參)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
증자가 말했다. “예, 그러합니다.”
공자가 나가자 제자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는 충(忠)과 서(恕)일 따름이다.” (제4편 이인)
子曰, 參乎 吾道 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 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공자가 일이관지(一以貫之)했다는 충(忠)과 서(恕)는 단지 마음의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룬다.
서(恕)는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충(忠)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하는 상태다. 서(恕)는 참는 것(忍)과 다르며, 충(忠)은 의무나 사명감과 다르다.
자타(自他)의 생명력을 최대로 신장하는 것이다.
즐겁지 않으면 가짜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력으로 전화(轉化)되지 않으면 가짜다.
이 지면에서 여기에 대해 상술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내가 협동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물적 토대가 상당히 갖추어진 조건과 경쟁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기실현의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 등은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나는 중견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꿈을 가끔 꿀 때가 있다.
이 때 그 내부의 동력은 표현을 무어라 하더라도 서(恕)와 충(忠)의 현대적 살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진보다.
5) 민관거버넌스의 성공적 정착을 그리며
윗 글은 민관거버넌스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약간 유추하면 관(官)이 갑(甲)이 되고, 민(民)이 을(乙)이 되는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는데, 민(民)과 관(官)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부(富)를 갑(甲)으로 바꾸고, 빈(貧)을 을(乙)로 바꿔서 읽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당당한 시민활동가들과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의지가 있는 공무원들이 만나야 한다.
시민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은 어떻게 하면 활동가들이 당당하고 즐겁게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정관념’ 없이 모색해야 한다.
공무원 가운데는 국장 급 이상의 간부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실무자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수시로 바뀌는 단체장의 의지보다 직업공무원의 상부가 변해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공무원 노조’가 이 역할을 스스로의 중요한 실천적 임무로 받아들이면,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공무원 사회 안에서 여러 벽을 허물고 거버넌스할 수 있는 기풍이 조성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자나 연구자들이 선진 외국의 변천 사례를 실용성 있게 연구하여 공급하는 일도 중요하다.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시민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모여드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은 그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